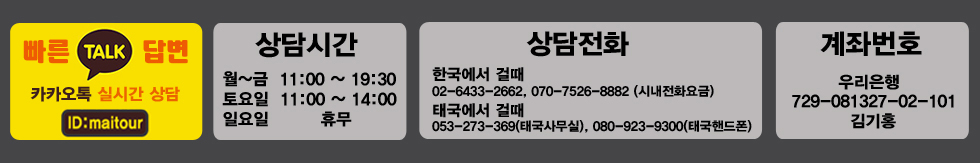바로 '비상구 좌석' 입니다. 정확히는 비상구 옆 좌석이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요. 이 자리는 유사시 승객들이 대피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고 앞뒤 간격도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만 있다면 비교적 편하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인지 일부 대형 항공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 좌석을 미리 배정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석에서 이런 좌석이 대략 8~12개 정도 됩니다. 이 좌석을 배정하는 방식은 저비용항공사와 대형항공사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좌석 중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거나 편한 좌석을 '프리미엄 석'으로 분류해서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뿐 아니라 외국의 저비용항공사들도 유사한데요.
노선에 따라선 1만 5000원 이상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이런 좌석을 구매한 승객은 수하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태그를 달아주는 등 다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비교적 항공요금이 저렴한 대신 지정 좌석 판매, 기내식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는 건 국내외 저비용항공사가 모두 비슷합니다.
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들은 비상구 좌석을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비상구 좌석을 배정하는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1순위는 자사 편승 승무원과 추가 탑승 승무원입니다. 참고로 '편승 승무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승무 업무를 위해, 또는 승무 업무를 끝낸 뒤에 승객의 신분으로 공항과 공항 간을 이동하는 승무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평소 비상 대응 요령 등을 훈련하고 숙지하고 있어서 일반 승객보다 유사시 대처가 훨씬 원활하기 때문이라는 게 항공사 설명입니다.
2순위는 승무원 이외의 대한항공 사원인데요. 이들 역시 기본적인 대응 요령은 익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순위가 일반 승객입니다.
비상구 좌석은 출발 당일 해당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배정합니다. 따라서 비상구 좌석을 원하는 경우 카운터 직원에게 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물론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좌석이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비상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작동할 수 있고, 다른 고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신체 건강한 고객으로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협력할 의사가 있는 승객'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별도 요금을 받고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는 저비용항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령 추가로 돈을 주고 비상구 좌석을 샀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유사시 비상구 손잡이를 당기거나 돌려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일정 정도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도 치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비상구 좌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운터 직원이 신체 건강 여부와 소통 능력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본다고 하네요.
또 15세 미만이거나 비상 탈출 관련 글 또는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도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콘택트렌즈나 안경 외에 다른 시력 보조장비가 필요한 경우, 돌봐야 할 어린이가 있어 비상 대응이 곤란한 승객 등도 비상구 좌석을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조건들에 비춰봐서 별문제가 없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적극적으로 비상구 좌석을 요구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침 비상구 좌석이 비어있다면 좀 더 편한 여행이 가능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비상구 좌석이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상시 대피 통로이고, 그 자리에 앉은 승객은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대응할 자신이 없다면 비상구 좌석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비상구 좌석은 편리함 뒤에 커다란 책무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